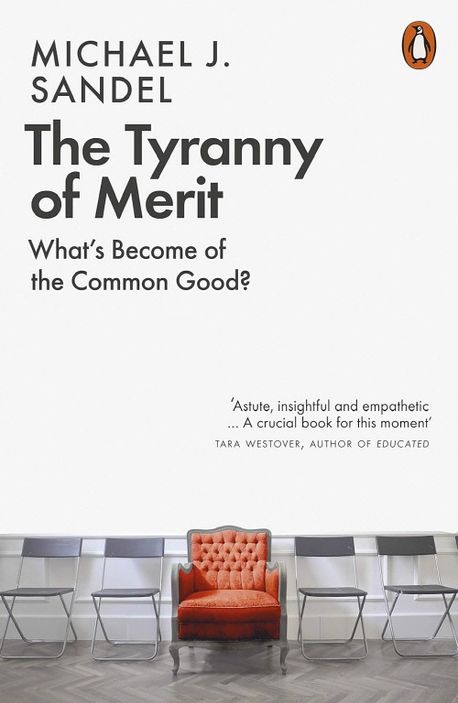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메리토크라시, Meritocracy)가 어떻게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한다
1. 능력주의의 문제점
현대 사회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신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격차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태어난 환경과 기회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2. 성공한 사람들의 ‘자격감’(Hubris)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온전히 ‘자기 노력’의 결과로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운이나 사회적 지원의 역할을 간과하고, 자신이 특별히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착각한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자책하게 된다.
3.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의 한계
명문 대학 입학이 사회적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면서, 대학 입시는 능력주의 경쟁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명문 대학 입학생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 출신이며,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이 공정한 기회 제공이 아니라,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능력주의가 사회를 분열시키는 방식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정당하게’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이 줄어든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며 좌절하고, 사회적 불만이 증가한다.
이러한 분열은 정치적으로도 반영되어, 능력주의적 엘리트층과 소외된 대중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5. 겸손과 연대의 필요성
샌델은 능력주의의 ‘오만(hubris)’을 버리고, 겸손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성공이 운과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운과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능력주의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사회적 연대와 겸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의의 개념이 필요하다.